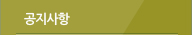이승만 대통령(왼쪽)이 1948년 7월24일 서울 중앙청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나 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연도 표기 방식이다. 태국은 부처의 탄생에서, 서구 유럽은 예수의 탄생에서 연도의 기준을 잡음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중심의 질서가 오랫동안 계속됐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연호를 함께 사용했다. 그러다가 화이질서가 무너지면서 각국은 자기 스스로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창건 후 500년 동안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다가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 직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라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조공외교 질서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 국가임을 선언한 것이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은 일본의 연호를 써야만 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왕이 취임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왕의 이름 뒤에 연도를 붙이고 있다. 중국식 연도 사용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한국은 어떤 방식의 연호를 사용했을까.
1948년 7월24일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의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24일”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란 정부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에 시작된 것이었고, 그의 대통령직도 1919년 시작되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한 정부는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임시정부에서 탄핵됐던 경험이 있었다.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1948년 5월10일 38선 이남에서 실시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통일 정부가 아닌 단독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연도 표기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단기를 사용했다. 서양식 연도에 2333년을 더한 숫자이다. 그럼에도 1951년의 8·15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19년에 우리 십삼도를 대표한 삼십삼인이 우리나라 운명을 개조하기 위하여 1776년에 미국 독립을 선언한 미국 창립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한국을 독립민주국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이 민주정부가 서울서 건설되어 임시로 중국에 가 있다가 삼년 전 오늘에 우리 반도 남방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독립절’ 또는 ‘광복 몇 주년 기념사’로 표현했다. 1954년에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오늘이 진정한 해방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반도의 반은 해방했다는 것은 사실이오”라고 하여 통일 정부의 수립 이전에는 진정한 해방이 없다고 규정했고, 1958년에는 건국이라는 말 대신 “정부수립 제10주년 기념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8·15에 대한 이런 방식의 해석은 1960년대에도 계속돼 ‘8·15 몇 주년 경축사’ 또는 ‘광복절 몇 주년 경축사’라는 방식으로 8·15를 기념해 왔다.
지금 8·15를 광복절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건국절로 할 것인가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몇 년 전 있었던 이 논쟁은 어렵지 않게 마무리됐다. 일본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최근의 원로 역사학자들 성명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건국절을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강조한다면, 독립운동가들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한 인사들은 건국의 반역자가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보듯이 실상 당시를 살아왔던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건국이나 정부수립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민이 해방된 것이고,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었고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반쪽만의 해방이고 반쪽 정부수립이고 반쪽 건국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전쟁 때 38선 이북으로 진격했으면서도 이북 5도 지역의 도지사를 임명할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제법적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광복절/건국절, 건국/정부수립의 논쟁은 사회통합을 해치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찬양하는 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가 고려하지 않았던 역사인식을 들고나오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